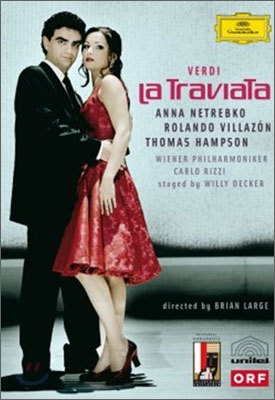
요즘 iPod으로 여러 종류의 오페라 공연 실황을 감상하고 있다. 특히
롤란도 비야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테너는 비야손과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이다) 이 영상을 구해서 보게 되었다. 원래 유럽에서는 오랜동안 오페라가 지속적으로 공연되어 왔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오페라 공연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게다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와 같이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라면 훌륭한 가수, 파격적인 연출, 뛰어난 지휘자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 공연은 가수진에 안나 네트렙코와 롤랜도 비야손, 거기에 토마스 햄슨까지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으로 포진을 하고 있고, 윌리 데커의 뛰어난 연출에 오페라 반주에 있어서는 항상 믿음직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카를로 리치가 빈 필을 지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나는 롤랜도 비야손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이 영상물의 진정한 주인공은 안나 네트렙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리아 칼라스의 비올레타 이후, 모든 이 역을 부르는 소프라노들은 칼라스와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칼라스의 연기와 노래는 비올레타 그 자체로 기억되고 있다. 안나 네트렙코는 아마 지금까지 비올레타 역을 맡은 소프라노들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 하는 가수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진 가수 중의 한 명일 것이며, 연출자의 의도에 맞추어 비올레타를 제대로 표현한 몇 안되는 가수 중의 한명일 것이다. 물론 그녀의 노래 역시 매우 뛰어나며, 칼라스에게서 들었던 몇몇 (악보와 다른) 고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결코 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야손 역시 표정이 뛰어난 노래를 들려주며 어디 한군데 모자라는 부분이 없다. 사실 좀더 날카롭게 그려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가 가진 목소리는 크라우스보다는 도밍고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가 보여주는 연기력 역시 매우 뛰어난 수준이었다. 토마스 햄슨이 베르디를 부르는 것은 다른 이탈리아 바리톤들이 베르디를 부를 때와는 분명 다른 느낌을 준다. 맥베스를 부를 때도 그랬고, 이번 오페라에서 제르몽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노래는 소리의 질감이나 양감에 중심을 둔 전통적인 이탈리아식이 아니고 가사와 그 느낌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세심한 심리적 표현에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며, 반면에 호탕하고 꽉찬 목소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공연의 연출 컨셉을 생각해 보면 햄슨의 기용은 가장 적절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연의 무대와 연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큰 흰색 무대와 소파, 커다란 시계, 비올레타를 따라다니는 흰 수염의 남자, 똑같은 가면을 쓴 똑같은 옷차림의 인물들, 그리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비올레타의 모습은 이 공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기호들이다. 어쩌면 가장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가 가장 탈시대적인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면을 쓴 사람들 속에서 붉은 원피스를 입은 비올레타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대중 속에서, 문화와 물질의 범람 속에서 느끼는 고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다. 오페라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동일한 연출과 동일한 음악, 고만고만한 가수들로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기호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공연이라면, 새로운 고민을 담고 있는 연출, 뛰어난 음악, 그리고 그 넓은 잘스부르크 무대를 좁게 보이게 만드는 뛰어난 가수들이 만들어 내는 이런 공연이라면 기존에 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페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멋진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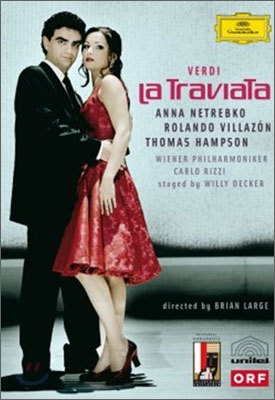 요즘 iPod으로 여러 종류의 오페라 공연 실황을 감상하고 있다. 특히 롤란도 비야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테너는 비야손과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이다) 이 영상을 구해서 보게 되었다. 원래 유럽에서는 오랜동안 오페라가 지속적으로 공연되어 왔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오페라 공연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게다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와 같이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라면 훌륭한 가수, 파격적인 연출, 뛰어난 지휘자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 공연은 가수진에 안나 네트렙코와 롤랜도 비야손, 거기에 토마스 햄슨까지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으로 포진을 하고 있고, 윌리 데커의 뛰어난 연출에 오페라 반주에 있어서는 항상 믿음직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카를로 리치가 빈 필을 지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나는 롤랜도 비야손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이 영상물의 진정한 주인공은 안나 네트렙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리아 칼라스의 비올레타 이후, 모든 이 역을 부르는 소프라노들은 칼라스와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칼라스의 연기와 노래는 비올레타 그 자체로 기억되고 있다. 안나 네트렙코는 아마 지금까지 비올레타 역을 맡은 소프라노들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 하는 가수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진 가수 중의 한 명일 것이며, 연출자의 의도에 맞추어 비올레타를 제대로 표현한 몇 안되는 가수 중의 한명일 것이다. 물론 그녀의 노래 역시 매우 뛰어나며, 칼라스에게서 들었던 몇몇 (악보와 다른) 고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결코 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야손 역시 표정이 뛰어난 노래를 들려주며 어디 한군데 모자라는 부분이 없다. 사실 좀더 날카롭게 그려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가 가진 목소리는 크라우스보다는 도밍고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가 보여주는 연기력 역시 매우 뛰어난 수준이었다. 토마스 햄슨이 베르디를 부르는 것은 다른 이탈리아 바리톤들이 베르디를 부를 때와는 분명 다른 느낌을 준다. 맥베스를 부를 때도 그랬고, 이번 오페라에서 제르몽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노래는 소리의 질감이나 양감에 중심을 둔 전통적인 이탈리아식이 아니고 가사와 그 느낌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세심한 심리적 표현에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며, 반면에 호탕하고 꽉찬 목소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공연의 연출 컨셉을 생각해 보면 햄슨의 기용은 가장 적절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연의 무대와 연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큰 흰색 무대와 소파, 커다란 시계, 비올레타를 따라다니는 흰 수염의 남자, 똑같은 가면을 쓴 똑같은 옷차림의 인물들, 그리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비올레타의 모습은 이 공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기호들이다. 어쩌면 가장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가 가장 탈시대적인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면을 쓴 사람들 속에서 붉은 원피스를 입은 비올레타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대중 속에서, 문화와 물질의 범람 속에서 느끼는 고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다. 오페라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동일한 연출과 동일한 음악, 고만고만한 가수들로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기호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공연이라면, 새로운 고민을 담고 있는 연출, 뛰어난 음악, 그리고 그 넓은 잘스부르크 무대를 좁게 보이게 만드는 뛰어난 가수들이 만들어 내는 이런 공연이라면 기존에 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페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멋진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요즘 iPod으로 여러 종류의 오페라 공연 실황을 감상하고 있다. 특히 롤란도 비야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테너는 비야손과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이다) 이 영상을 구해서 보게 되었다. 원래 유럽에서는 오랜동안 오페라가 지속적으로 공연되어 왔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오페라 공연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게다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와 같이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라면 훌륭한 가수, 파격적인 연출, 뛰어난 지휘자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 공연은 가수진에 안나 네트렙코와 롤랜도 비야손, 거기에 토마스 햄슨까지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으로 포진을 하고 있고, 윌리 데커의 뛰어난 연출에 오페라 반주에 있어서는 항상 믿음직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카를로 리치가 빈 필을 지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나는 롤랜도 비야손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이 영상물의 진정한 주인공은 안나 네트렙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리아 칼라스의 비올레타 이후, 모든 이 역을 부르는 소프라노들은 칼라스와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칼라스의 연기와 노래는 비올레타 그 자체로 기억되고 있다. 안나 네트렙코는 아마 지금까지 비올레타 역을 맡은 소프라노들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 하는 가수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진 가수 중의 한 명일 것이며, 연출자의 의도에 맞추어 비올레타를 제대로 표현한 몇 안되는 가수 중의 한명일 것이다. 물론 그녀의 노래 역시 매우 뛰어나며, 칼라스에게서 들었던 몇몇 (악보와 다른) 고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결코 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야손 역시 표정이 뛰어난 노래를 들려주며 어디 한군데 모자라는 부분이 없다. 사실 좀더 날카롭게 그려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가 가진 목소리는 크라우스보다는 도밍고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가 보여주는 연기력 역시 매우 뛰어난 수준이었다. 토마스 햄슨이 베르디를 부르는 것은 다른 이탈리아 바리톤들이 베르디를 부를 때와는 분명 다른 느낌을 준다. 맥베스를 부를 때도 그랬고, 이번 오페라에서 제르몽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노래는 소리의 질감이나 양감에 중심을 둔 전통적인 이탈리아식이 아니고 가사와 그 느낌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세심한 심리적 표현에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며, 반면에 호탕하고 꽉찬 목소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공연의 연출 컨셉을 생각해 보면 햄슨의 기용은 가장 적절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연의 무대와 연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큰 흰색 무대와 소파, 커다란 시계, 비올레타를 따라다니는 흰 수염의 남자, 똑같은 가면을 쓴 똑같은 옷차림의 인물들, 그리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비올레타의 모습은 이 공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기호들이다. 어쩌면 가장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가 가장 탈시대적인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면을 쓴 사람들 속에서 붉은 원피스를 입은 비올레타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대중 속에서, 문화와 물질의 범람 속에서 느끼는 고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다. 오페라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동일한 연출과 동일한 음악, 고만고만한 가수들로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기호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공연이라면, 새로운 고민을 담고 있는 연출, 뛰어난 음악, 그리고 그 넓은 잘스부르크 무대를 좁게 보이게 만드는 뛰어난 가수들이 만들어 내는 이런 공연이라면 기존에 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페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멋진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